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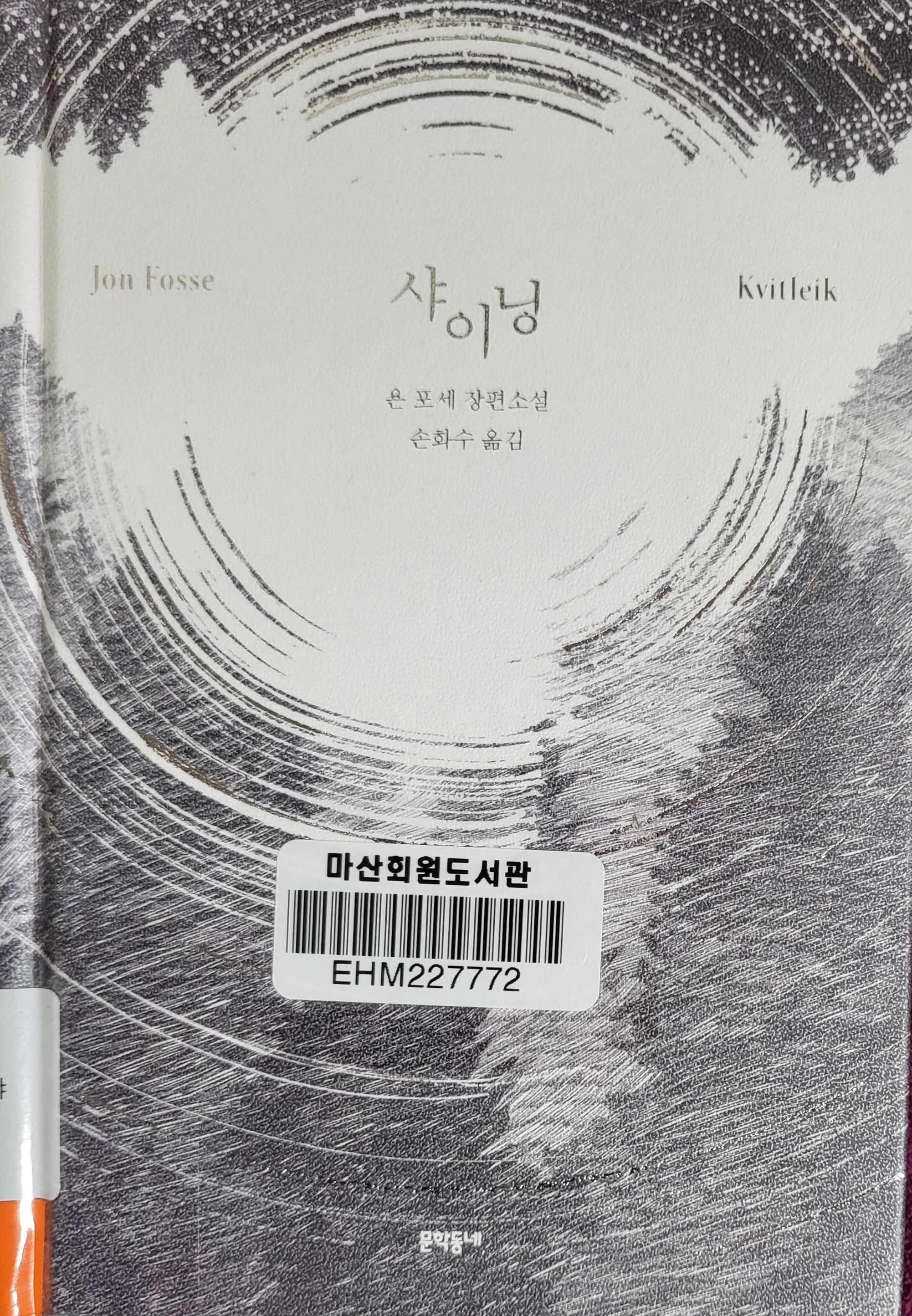
욘 포세 Jon Fosse
1959년 노르웨이의 해안도시 혜우게순에서 태어났다. 베르겐대학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했고, 호르달란주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쳤다. 저널리스트, 작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성서를 번역하기도 했다. 1983년 장편소설 "레드, 블랙"으로 데뷔했고, 1994년 첫 희곡 "그리고 우리는 결코헤어지지 않으리라."를 발표했다.
소설'보트하우스" "아침 그리고 저녁." "멜랑콜리아I-II," "3부작" "7부작"등을 썼으며, 희곡"누군가 올 거야." "이름" "어느 여름날" "가을날 의 꿈" "죽음의 변주곡" "나는 바람이다."등을 썼다. 현재까지 그의 연극은 전세계에서 1000회 이상 공연되었고, 40년간 뉘노르스크어로 쓴 작품들은 수많은 상을 휩쓸며 50여 개국에 소개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목소리를 부여한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을 인정받으며 20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데뷔 40주년에 발표한 소설"사이닝" 은 희곡 "검은 숲속에서" 로도 나왔으며, <뉴요커> <파이낸셜타임스> 선정 2023 최고의 책'으로 꼽혔다.
🌐🌐🌐읽기 전에
도서관에서 읽을 책을 찾다가 눈길이, 손길이 동시에 간 책인데 무지하게도 나는 이 책이 2023년도 노벨 수상작가의 작품인 줄은 몰랐다.
집에 와서 책장을 넘기고서야 비로소 "욘 포세" 작가의 소설이란 거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라 그런지 소설의 내용은 무겁고, 언어는 측량되지 않는 깊이가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때로는 모순이 되는 모습으로, 또 다르게는 충분히 긍정되는 사실이 나에게 다가왔을때 혼란한 감정을 바로 세우기가 쉽지는 않았다.
🌐🌐🌐차례
1.자가용과 숲의 의미
2.눈과 순백
3.부모
🛶🛶자가용과 숲의 의미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을 바라보듯 앞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을 때 나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텅 빈 무의 세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내 앞에 있는 건 숲이다 그저 숲일 뿐이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어느새 나는 숲속으로 들어오게 된것이다.
♨️♨️삶은 자동차가 미지의 길을 좌충우돌 하는 것과 같이 달콤한 오욕의 광장에서 헤메다가 길이 끊어진 숲에서 마지막 에너지마저 고갈되고 멈추어선다.
숲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이며, 그곳은 때로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죄 많은 나의 한평생에 걸쳐 단 한 번도, 이 같은 일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이 비슷한 일조차 일어난 적이 없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에 이렇게 숲속에 들어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제 날은 점점 더 어두워져 곧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컴컴해질 것이며, 어디에서도 어느 무엇도 찾지 못할 것이고, 결국 내 차가 어디 있는지조차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상황이 있을까,
♨️♨️평생에 걸쳐 똑같은 일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모르는 길을 찾아서 갈 뿐.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강력한 침묵 뿐.
이제 숲속은 너무나 캄캄해서 설사 오솔길을 다시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발자국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나는 몸을 일으켜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든 계속 걷다보면 나는 다시 오솔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바로 그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을 것이다.
♨️♨️이미 숲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치밀하게 구성되고 똥제된 신의 영역이다. 오로지 신의 뜻에 따르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지만 신의 방법을 쉽게 알 수 조차 없다.
🛶🛶순백
빛이었다. 그 빛은 강렬했으나 눈이 아프진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졌다. 놀랄 정도로 편안하고 좋았다. 그 하얀 존재와 나. 그에게 말을 걸어볼까. 아니, 존재를 향해 다가가볼까, 하지만 그 존재는 내 바로 앞에 서 있고, 내가 그 존재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나는 정면에 서 있는 그 존재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노르딕 류의 "사자의 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죽음의 과정을 세세하게 기술한 그 책의 일부가 캡쳐되면서 하얀 순백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껴본다.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 순백색의 존재는 왜 숲 속에 서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그것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내게 다가왔고, 이제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 존재는 처음엔 밝게 빛나는 하얀 윤곽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온통 밝게 빛나는 하나의 형체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순백색으로 밝은 빛을 내뿜는 이 존재 앞에 무작정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다가가고 있었다. 순백의 존재는 이미 나의 존재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치밀한 신의 통제 아래에서.
🛶🛶부모
숲속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부부처럼 보이는 나이 지긋한 남녀 한 쌍을 향해 계속 다가간다. 그들이 부부인 것은 확실하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봐야겠다. 나는 소리친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소리 가 들린다: 안녕하세요. 나는 소리친다: 거기 누가 있나요ㅡ 그렇다고 대답하는 희미한 목소리는 나이 많은 여인의 것이다. 뒤이어 들려오는 것은 똑같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남자의 목소리다.
♨️♨️ 나는 삶의 과거로 돌아가고픈 간절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나는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그것이 왜 잘못 된. 일이란 말인가.나쁜 일도 아니지 않은가. 목소리가 다시 외친다: 거기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 봐, 넌 거기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 무엇이든 하란 말이야 목소리의 주인은 내 어머니고, 나는 부모님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말한다: 네가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적어도 네가 그 정도는 하고 있으니 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는다.
♨️♨️과거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부모님은 끌어 당기는 사람인가? 밀어내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저기엔 순백색의 존재가 빛을 발하며 서 있고, 그 존재의 뒤쪽에서 옆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으며.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와 순백색의 반짝이는 존재 사이에는 나의 부모님,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기 때문이다.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팔은 마치 V자처럼 보인다. 그렇다. 그들이 틀림없다. 나의 부모님이다. 그들이 나를 바라본다. 나를 똑바로 쳐다본다.
♨️♨️존재의 의식이 사그러진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갈 데라곤 없는데 그래도 가야한다.
순백색의 하얀 존재는 텅 빈 무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이 책의 마지막 단어
각각의 순백색 속에서 삶이란 오랜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 갈 뿐이다. 강한 침묵의 숲속으로 이제는 들어 갈 시간이다.
'독서의 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일랜드 쌍둥이/ 홍숙영 장편소설 (74) | 2025.04.22 |
|---|---|
| 메마른 삶/그리실라우스 하무스 임소라 옮김 (71) | 2025.04.21 |
|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 되르테 쉬퍼 지음/유영미 옮김 (47) | 2025.04.19 |
| 머문 자리-김산아 소설집 (61) | 2025.04.18 |
| 엄마를 절에 버리러/ 이 서수 소설 (72) | 2025.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