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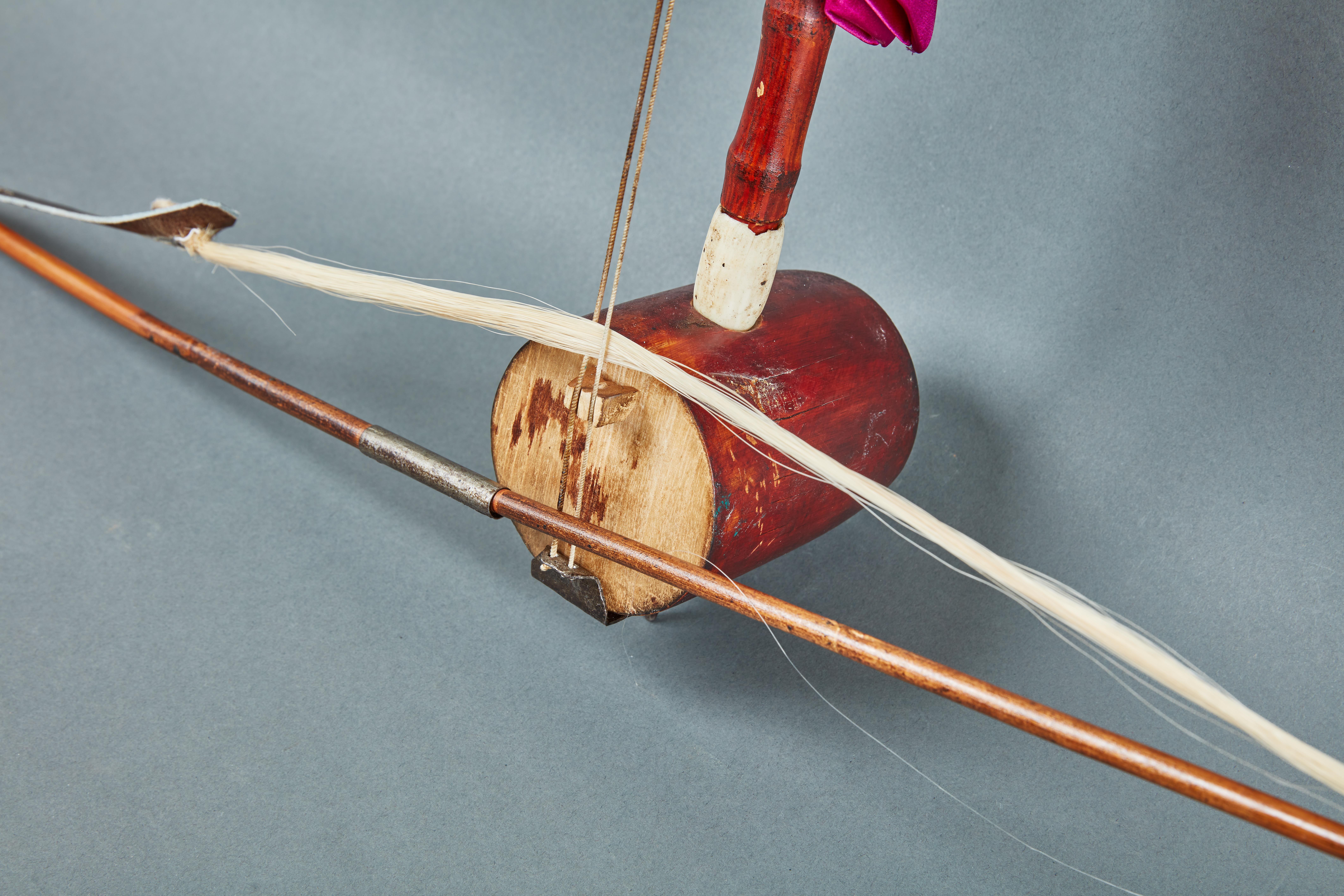


경기도 등록문화유산
지영희 유품 악기 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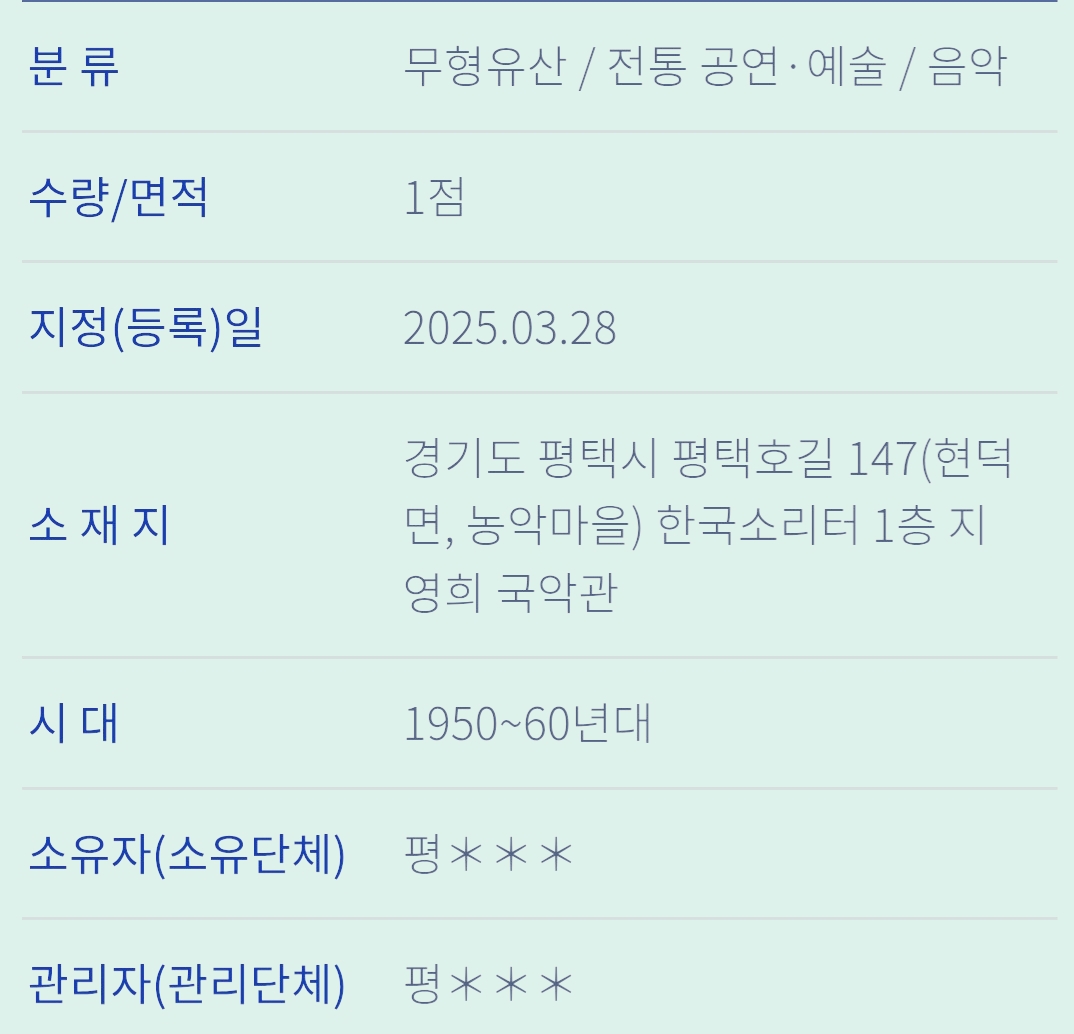
문화유산 해설
지영희 유품 악기 해금은 현재 지영희국악관에 소장 중이다. 지영희가 활동하던 당시는 악사들이 자신의 악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이 흔했다. 더군다나 지영희는 악기 개량을 직접 할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다. 이 해금도 지영희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 악기로 보인다. 지영희 해금의 형태는 앞서 살펴본 1848년의 '헌종무신진찬의궤'부터 '고종임인진연의궤'에 보이는 것과 이왕직아악부에서 사용된 해금들과 유사하다. 입죽이 줄 방향으로 휘어지고, 입죽의 윗부분에 주아가 위치하여 줄과 입죽의 간격이 넓다. 산성도 주아에 매어져 있으며 투박하지만 감잡이 역시 존재한다. 즉 지영희 해금의 전체적인 외관은 당대의 역안 해금들의 특징을 보이며 19~20세기에 제작된 해금의 전통적인 형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심지어 지영희의 해금은 연주할 때 시김새가 잘 표현되어, 현재 제작되는 해금보다 더 뛰어난 음색을 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농현이 편안하게 연주되는데 역안법으로 연주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한다. 따라서 지영희의 해금은 전통적인 외관은 물론 실제로 연주할 때도 민속 음악의 연주 주법을 오롯이 구현해 내는데 적합하게 제작된 전통성을 내포하고 있는 악기이다.
한편 지영희의 해금은 분리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먼저 입죽은 공명통으로부터 탈부착이 가능하며 2개로 분리된다. 주아 아래쪽에 쇠로 된 판이 입죽을 감싸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입죽의 위, 아래가 분리되는 구조이다. 또한 활대의 중간 부분도 입죽과 마찬가지로 쇠로 된 넓은 판이 감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활대가 절개된다.
지영희가 절해금을 제작하여 사용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적합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해금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해금은 야외에서 공연할 때에는 음량이 커야 하기 때문에 울림통을 큰 것을 써야 하나, 풍류를 연주할 때는 울림통이 작아야 한다. 또 민요를 연주할 때는 대를 짧게 쓰고 대풍류를 연주할 때는 대의 길이가 길어야 한다. 현재는 연주자들이 각기 3~4대의 악기를 갖추고 상황에 따라 다른 악기를 사용하지만, 지영희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악기가 귀했다. 그래서 부품을 따로 만들어두고 악기를 분리하여 부품만 갈아 끼우는 편이 용이했을 것이다. 지영희가 악기 제작에 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는 지영희는 이동의 편리를 위해 절해금을 제작하였다. 사실 현악기 중에는 절해금 외에도 분리형으로 제작된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이 전하고 있다. 이 분리형 악기들은 일제강점기 이래로 순회공연이 많았던 민속 음악 연주자들이 휴대와 이동의 편리를 위해 고안해 낸 결과로 생각된다. 6ㆍ25전쟁으로 인한 피난 역시 악사들이 악기를 휴대하기 쉽게 개량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
이 해금은 지영희 명인이 1974년 미국으로 가기 직전에 자신의 남동생인 지광희에게 물려주었다. 지영희와 지광희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종목이 같았기 때문에 지광희는 형의 악기를 작고 전까지 22년간 부수하며 사용하였다. 지광희는 작고 일주일 전인 1996년 12월 4일경(추정)에 지영희의 손자인 강봉천에게 지영희로부터 증여받은 악기를 모두 전해주었다. 강봉천은 해금 연주자가 아니었기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2015년 지영희국악관에 기증하였다.
(출처:국가유산포털)
'문화유산 산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산회상도 (42) | 2024.12.29 |
|---|---|
| 삼광사 경장 (47) | 2024.11.18 |
| 문화유산 산책 / 빗 (26) | 2024.10.28 |
| 문화유산 산책-경주 서봉총 허리띠 (51) | 2024.07.08 |
| 문화유산 산책-김광균 굴레 (66) | 2024.07.07 |



